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17일 |
|---|---|
| 이용안내 ? |
|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
| 파일/용량 | EPUB(DRM) | 28.79MB ?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18만자, 약 5.6만 단어, A4 약 113쪽? |
| ISBN13 | 9788932966403 |
| KC인증 |

 음성 검색
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QR/바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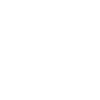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