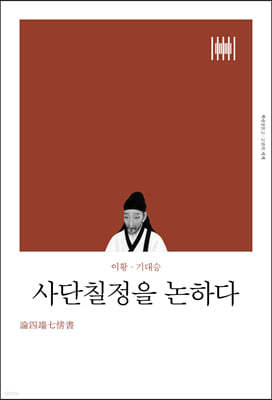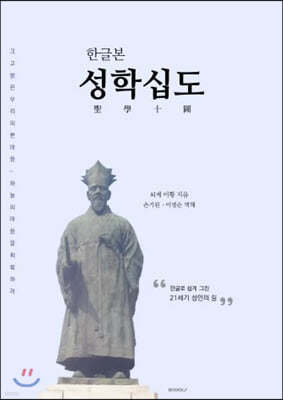저 : 황간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황간
관심작가 알림신청
황간(黃?, 1152∼1221)은 이름은 간(?), 자는 직경(直卿)이며, 민현[?縣, 지금의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 사람이다. 황간은 부친이 작고한 뒤에 주희의 제자인 유청지(劉?之, 1134∼1190)의 권유로 주희에게 수학했다. 그는 주희의 문하에서 학업을 펼친 후에 밤에도 자리를 깔고 눕지 않았으며,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조금 피곤하면 의자에 잠시 앉아 새벽까지 그대로 지낼 때도 있었다. 주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황간은 뜻이 굳고 생각이 맑으니 그와 더불어 지내면 매우 유익하다”라고 칭찬했다. 후에 주희는 그 딸을 황간에게 시집보냈다. 영종(寧宗)이 즉위하자 주희는 황간에게 명해 표문(表文)을 올리게 했는데 이때 장사랑(將仕?)에 보임되고, 감태주주무(監台州酒務)의 직책을 받았다. 주희는 자신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심의편(深衣篇)〉과 다른 저술들을 황간에게 전해 주면서, “나의 도를 부탁할 곳이 여기에 있으니 유감이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직접 기록했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황간은 3년간 심상(心喪)의 예를 차렸다. 그 후에 감가흥부석문주고(監嘉興府石門酒庫)의 직책을 받았다. 오엽(吳獵)이 호북 지역을 다스릴 때에 황간을 불러 안무사주고(安撫司酒庫)에 임명했고, 강서제거상평(江西提擧常平) 조희역(趙希?)은 황간을 불러 임천령(臨川令)으로 세웠다. 이후 안풍군(安?軍), 한양군(漢陽軍), 안경부(安慶府) 등의 지방관을 맡았는데, 황간은 부임하는 곳마다 학교를 소중히 여기고 교육을 앞세웠다.
제치사(制置使) 이각(李珏)이 황간을 불러 참의관(參議官)으로 삼고자 했으나 황간은 그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주 지역을 맡으라는 명을 거듭 사양했다. 그 후 다시 안경(安慶) 지역을 맡으라는 명이 있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여산(廬山)에 들어가 주희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이번(李燔), 진복(陳宓)과 함께 옥연(玉淵)과 삼협(三峽)의 사이를 돌아보고 스승 주희가 남긴 발자취를 탐방했다. 그가 백록동서원에서 건괘와 곤괘 두 괘를 강의했을 때는 산남과 산북의 선비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재소(行在所)에 불려 가 시사 문제를 아뢰고 대리승(大理丞)의 직책을 제수받았으나 이를 받들지 않아 어사 이남(李楠)의 탄핵을 받았다. 황간이 처음 형호(荊湖)의 막부에 들어갔을 때 강호의 호걸들과 교유했는데, 당시 호걸들도 황간에게 기개와 큰 뜻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안경 지역에 와서 제치사 이각의 막부 일을 겸하게 되자 장회(長淮) 지역의 군민들이 마음속 깊이 복종했다. 이러한 소문이 나자 그 지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그를 더욱 시기하게 되었다. 더욱이 황간이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게 되면 변방의 실태를 그대로 보고해 황제가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될까 두려워해서 무리를 지어 방해했다. 황간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날로 불어나 파(巴)·촉(蜀)·강(江)·회(淮) 지역의 이름난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예서》의 편찬과 저술에도 시간이 부족했지만,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경의(經義)에 대한 강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근 사찰을 빌려 거처하며 의문 나는 점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는데, 마치 스승 주희가 살았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얼마 후에 조주(潮州) 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고, 박주(?州)의 명도궁(明道宮)을 주관하다가 이것마저 은퇴를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작고한 후에는 문인들의 요구로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저술로는 《경해(經解)》와 《황면재선생문집(黃勉齋先生文集)》 등이 있다.
제치사(制置使) 이각(李珏)이 황간을 불러 참의관(參議官)으로 삼고자 했으나 황간은 그가 함께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주 지역을 맡으라는 명을 거듭 사양했다. 그 후 다시 안경(安慶) 지역을 맡으라는 명이 있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여산(廬山)에 들어가 주희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이번(李燔), 진복(陳宓)과 함께 옥연(玉淵)과 삼협(三峽)의 사이를 돌아보고 스승 주희가 남긴 발자취를 탐방했다. 그가 백록동서원에서 건괘와 곤괘 두 괘를 강의했을 때는 산남과 산북의 선비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재소(行在所)에 불려 가 시사 문제를 아뢰고 대리승(大理丞)의 직책을 제수받았으나 이를 받들지 않아 어사 이남(李楠)의 탄핵을 받았다. 황간이 처음 형호(荊湖)의 막부에 들어갔을 때 강호의 호걸들과 교유했는데, 당시 호걸들도 황간에게 기개와 큰 뜻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안경 지역에 와서 제치사 이각의 막부 일을 겸하게 되자 장회(長淮) 지역의 군민들이 마음속 깊이 복종했다. 이러한 소문이 나자 그 지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그를 더욱 시기하게 되었다. 더욱이 황간이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게 되면 변방의 실태를 그대로 보고해 황제가 저간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될까 두려워해서 무리를 지어 방해했다. 황간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날로 불어나 파(巴)·촉(蜀)·강(江)·회(淮) 지역의 이름난 선비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예서》의 편찬과 저술에도 시간이 부족했지만,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경의(經義)에 대한 강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근 사찰을 빌려 거처하며 의문 나는 점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는데, 마치 스승 주희가 살았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얼마 후에 조주(潮州) 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고, 박주(?州)의 명도궁(明道宮)을 주관하다가 이것마저 은퇴를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작고한 후에는 문인들의 요구로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저술로는 《경해(經解)》와 《황면재선생문집(黃勉齋先生文集)》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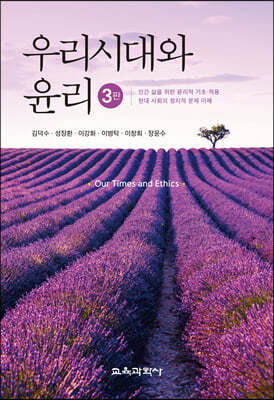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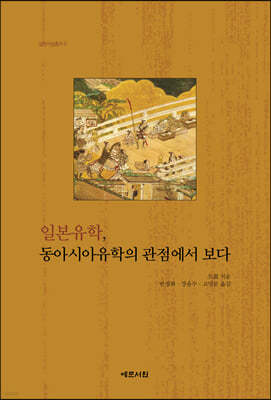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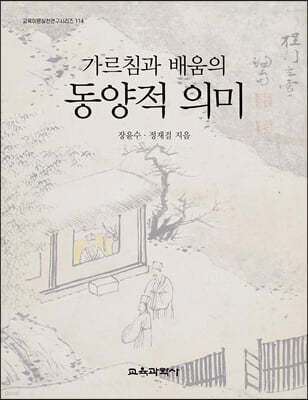



![[그래제본소] 이황](https://image.yes24.com/goods/128182437/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