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귀뚜라미 이야기를 하지. 송귀뚜라미는 서울 사람인데, 노래를 무척이나 잘 불렀어. 그 중에서도 귀뚜라미 흉내내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별명도 아예 ‘귀뚜라미’가 된 거야. 송귀뚜라미는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노래를 배웠어. 소리내는 법을 얼마만큼 익힌 다음에는 날마다 폭포 있는 데 가서 노래 연습을 했다지. 폭포 물이 콸콸 넘쳐흐르고 퐁퐁 튀기고 쏴아 쏴아 시끄럽게 떨어지는 데서 소리 내는 연습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한 일 년 넘게 연습을 하니까, 드디어 제 목소리만 들리고 폭포 물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더래.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넋을 놓고 꿈꾸는 것처럼 노래하기도 했대. 처음에는 소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영 가지런하지를 못하더니, 한 일 년 넘게 연습을 하니까 회오리바람이 몰아쳐도 소리가 흩어지지 않더래.
--- p.11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서방님은 산 속 절간에서 공부 잘 하고, 날마다 몸 편히 잘 계시나요? 늘 서방님을 생각하며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저는 서방님이 떠나신 뒤로 어쩌다가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점점 뼛속에 사무쳐 아무리 약을 쓰고 음식을 잘 먹어도 차도가 없군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복 없는 사람이 살아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세 가지 큰 아쉬움이 마음에 구차하게 남아 있어 죽어도 눈을 감기 어렵습니다.
--- p.43-44
어느 날 밤, 내가 등잔 기름이 다 닳은 뒤에 잠이 들었는데 실컷 자고 깨어 보니 아직 캄캄하더라고. 그래서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물었지.
“밤이 얼마나 됐느냐?”
“아직 자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잠이 들었어. 실컷 자고 깨어나서 또 아이한테 물었지.
“밤이 얼마나 됐느냐?”
“아직 닭 울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억지로 잠을 청했지마는 잠이 와야 말이지. 몸을 뒤척뒤척하다가 일어나서 또 아이한테
물었어.
“밤이 얼마나 됐느냐? 방 안이 환한 걸 보니 날이 샌 게지.”
“아니, 아직 날이 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환한 것은 달빛이 지게문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쳤어.
“아이고 참, 겨울밤이 길기도 하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뭐랬는지 알아?
“무슨 밤이 길다고 그러십니까? 나리한테나 긴 게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을 내어 따졌지.
“뭐라고? 왜 그런지 어디 한번 말해 봐라. 말 못하면 혼내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차근차근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 썩 그럴 듯하더라고.
너희들도 한번 들어 볼래?
--- p.122-123

 QR/바코드 검색
QR/바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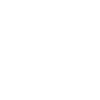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