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는 카메라를 메고 물범을 보러 갔다. 여름 한 철 얼음이 풀리는 툰드라의 들판은 발을 딛을 때마다 폭신폭신했다.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조깅 코스보다 밟는 느낌이 좋아 깡충깡충 뛰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만이 아니다. 툰드라의 식물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여름 한 철 살아보겠다고 꽃 피우고 번식하는데, 그걸 꺾거나 짓밟으면 안 된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진짜 북극인 스발바르에서 그렇게 배웠다. ‘개념 있게’ 앞 사람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가려고 했지만, 인적은 까마득히 없었고 바닥엔 트랙터 자국만 패어 있었다. 산과 들판, 하늘과 바다. 그 경계가 만나는 지역은 알 수 없는 기상 현상으로 뿌옇게 흐려져 몽환적으로 보였다. 들판의 끝에 도착하니 검은 모래사장과, 푸른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는 라군이 나타났다.
--- p.60
고틀란드에는 한 개의 도시와 여러 개의 마을이 있다. 그 하나의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아름다운 중세도시 비스뷔다. 비스뷔는 스페인 남부의 중세도시 톨레도보다 특이하고, 스위스 꽃의 도시 루체른보다 화려하고, 프랑스 남부의 성곽 마을 보나보다 사랑스럽다. 즉 그때까지 내가 알던 유럽의 그 어떤 중세도시보다 아름다웠다. 네덜란드 문화사학자 요한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을 벽돌로 써낸다면 그것은 비스뷔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낮은 언덕 위에 성이 있고, 자갈을 깐 구불구불한 골목들이 그물처럼 이어지고, 길을 잃고 고개를 들면 쓸쓸하게 무너져내린 중세의 건물들이 문득 나타나는 도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세계가 지금보다 5세기가량 더 젊었을 때……’ ‘피비린내와 장미향이 뒤섞인 삶……’ 같은 호이징가의 아름다운 문장들이 허공에 금박으로 나타났다 스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 p.120
순록들은 똥개마냥 한낮에도 마을을 어슬렁거렸다.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무언가를 열심히 뜯어 먹고 있었다. 군데군데 털도 빠져 있고, 얼굴도 까칠해 보였다. 나중에 들으니 여름에 이끼라도 먹어둬야 몸에 지방을 축적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한다. 스발바르 순록들은 십 킬로그램까지 지방을 몸에 축적할 수 있도록 진화했단다. 겨울엔 눈을 ‘뜯어’ 먹는다. “눈에도 약간의 양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안쓰러웠다. 참으로 힘든 삶 선택하셨다.
--- p.164
버기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북극곰은 결국 아무런 수확 없이 떠났다. 야생동물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폴라베어 인터내셔널 활동가에게 귀 따갑게 잔소리를 들은 관광객들은 콩고물 하나 던져주지 않았다. 엉덩이를 흔들며 사라지던 곰은 멀찌감치 툰드라 덤불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배를 긁으며 낮잠이라도 잘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에 만난 또 다른 북극곰도 낮잠을 자고 있었다. 쪼그리고 엎드려 자는 모습이 인형처럼 귀여웠다. 그게 끝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우리는 고든 곶의 지형지물을 외울 만큼 뺑글뺑글 돌았지만 더는 북극곰을 보지 못했다. 전 세계 북극곰의 수도 처칠, 그중에서도 북극곰이 떼로 몰려다닌다는 고든 곶에서. 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무릎에 내려놓았다. “어린이대공원 썰매한테 처칠 친구들 안부라도 전해주려고 했는데…….” 인간 북극곰이 대답했다. “그러게, 영 면목없게 됐어.”
--- p.221
나는 포인트호프 도착 네 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는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에드나가 친절하게도 “저녁이나 먹고 가라”며 근처 집으로 불쑥 들어갔다. 전형적 에스키모 가옥, 즉 조립식주택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가득했다. 주름이 잔뜩 잡힌 할머니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부엌에 백조 수프 끓여놨으니 먹어라”라고 말한 뒤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 집에도 없는, 사십 인치는 넘어 보이는 최신형 완전 평면 텔레비전이었다. 아이들은 소파에서 뒹굴며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을 주먹으로 부수고 있었다. 현관에는 털부츠 대신 구멍 숭숭 뚫린 ‘크록스’ 슬리퍼가 뒹굴었다. 맙소사, 정말이지 세계는 하나였다.
--- p.267
‘캐라스 비앤비’의 버사 캐라스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얗게 센 단발 파마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몸집도 마음도 넉넉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둔갑한 주인공 할머니를 좀 닮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느릿느릿 말해서 좋았다. 한국에서 전화로 이 집을 예약했는데, 이 사람 좋은 할머니는 “혹시 렌터카 업체 전화번호 있으세요?”라는 내 말에, 집 전화번호부를 다 뒤지고 마당에 나가 잔디 깎는 남편을 불러서까지 물어봐줬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가는귀를 약간 먹은 상태였다. 두 사람의 “뭐어라아고오오?” “아아니이이이” 같은 대화를 전화기 너머로 들으며, 국제전화요금 딸깍딸깍 올라가는 소리에 괜히 물어봤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어쨌거나 버사는 인정스러운 할머니였다. 아무리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진다지만, 일요일 새벽 네 시에, 난생처음 보는 외지인들을 데리러 자동차를 몰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집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열 시간도 넘게 걸린다며? 얼마나 피곤하겠누.” 우리가 케치칸에서 페리를 타고 왔다는 사실을 굳이 발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나저나 왜 이 집에 일본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일까. 버사 할머니는 운전석 백미러로 우리를 흘깃 보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게 한 사진작가 때문이야. 호시노 미치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또 호시노 미치오였다.
--- p.331

 QR/바코드 검색
QR/바코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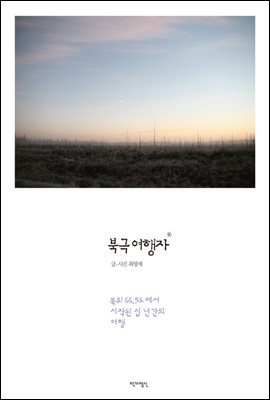

![[사락] 매월 혜택 증정! 꾸준하게 독서모임](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jpg)







